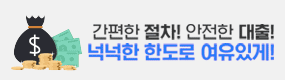형수-맛있는섹스 - 13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양평 주유소에서 그녀와 헤어진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걱정스러운 어머님의 눈길을 뒤로하고
2층 내 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윤경란, 45의 나이답지 안게 정열적인 생동감이 넘치는 카페 여주인의 이름이다.
대포 항에 도착한 우리는 운 좋게 구한 자연산 다금바리와 광어회를 소주와 맛나게 걸쳐댔다.
바다는 인간에게 자유와 여유를 준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했던 것들도 튀어나와 파도를 타고 소리를 질러대기도 한다. 그녀와 나도 그랬다. 일출이 시작되는 여명 무렵 그녀가 아까와는 달리 그녀의 어두운 그림자를 털어 놓기 시작했다.
대구 **대 메이퀸으로 날리던 그 시절, 그녀는 대구에서 몇 째 안가는 섬유회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한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거기에 도쿄대 출신인 남편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혼 생활을 하던 그때 호사다마라던가 일이 터졌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돼 버린 것이다.
그 후 5년이란 세월을 남편을 간호하며 지내던 그녀는 어느 날 밤 지금의 남편인 운전기사 강**에게 강간을 당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람을 유치장에 쳐너었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게 두려웠던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그에게 질질 끌려 다니게 돼 버렸었다. 그러다가 임신까지 하게 됐고 결국은 그 사람과 대구를 떠나 여기 저기 다니다가 일 년 전쯤 친정의 도움으로 양평에 정착을 했다고 한다.
그녀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을 전 남편에게 볼 면목이 없다며 훌쩍훌쩍 눈물을 흘린다.
차로 돌아온 우리는 취기가 어느 정도 가실 때까지 주차장에서 잠을 청했고, 그때 나도 그녀에게 내 그늘을 털어 놓았다. 재혼하신 부모님일이며, 이복형제의 일, 그리고는 결국 형수와 주희의 일까지.. 가감 없이 솔직히 모든 걸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내 이야기가 다 끝나자 순간순간 야릇한 표정을 짓던 그녀의 얼굴이 사뭇 진지하다.
"자갸, 진짜 사냥꾼은 자기가 잡은 새든 스스로 날아든 새는 새장 안에 가둬두지 안는데.. "
나는 대답대신 손을 그녀의 추리닝 속에 밀어 넣으며 은밀한 곳을 기습했다.
보지 물로 흥건히 젖어있다. 그녀의 보지 속에 손가락을 밀어 넣으며 말했다. "
"피.. 남은 심각하게 말하는데.. 이게 뭐에요?"
"어머, 내가 무슨 보살인줄 아나봐? 그런 말 듣고 아무러치도 안은 사람 있음 자기가 데려와바.."
"하하, 그런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며 그녀의 클리를 만져본다.
"아이이, 안 돼 자기야.. 저기 사람들이.." 그녀가 내손을 잡아 슬그머니 빼놓는다.
그렇게 윤경란 그녀와의 우연이었지만 뜨거웠던 만남을 되새기다가 잠이 들었다.
아름다운 새들이 내 주위를 날고 있다. 나는 새장을 열고 새 들을 잡아넣는다.
내 새장이 아름다운 새들로 가득 찼고 나는 새장 문을 닫아걸었다.
갑자기 새장속 새들이 날갯짓을 시작하며 새장 밖으로 깃털을 뿜어내고 있다.
그 중 한마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안 돼"
다시 한 마리가 쓰러진다.
"안 돼에"
또 다시 쓰러진다.
"안돼에에에"
잠에서 깨어났다. 얼마나 잔걸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온다.
"무슨 꿈이 이렇지.."
솓구쳐오르는 갈증에 물을 찾아 거실로 나갔다.
어머님이 점심을 준비 중이시다.
"무슨 잠을 그렇게 자니?"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웬 음식?"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라, 니 형수도 곧 올꺼고.."
"네, 엄마"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찾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방으로 다시 들어온 나는 침대에 몸을 뉘였다.
"형수가 온다고?"
그러고 보니 형수와 만난 지도 꽤 된 것 같다.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켜 침대 밑에서 포장된 박스를 찾아 꺼냈다.
다음 달 형수님 생일 선물이다. 내 얼굴에 짓궂은 미소가 머금어 진다.
"그냥 오늘 쓸까?"
망설이던 나는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꺼냈다.
핑크색 딜도다. 귀두 부분이 유난이 두껍고 몸체에는 오돌토돌 돌기들이 솟아 있다.
건전지를 끼고 리모트를 누르자 뱀처럼 똬리를 틀며 회전을 시작한다.
형수님의 반쯤 벌어진 입사이로 들어난 고운 치아와 감겨있는 혀가 보일 듯 말 듯 한 야릇한 표정이
떠올라지며 아래쪽이 묵직해 진다.
딩동
밖에서 벨이 울린다.
"정후야, 좀 나가보렴"
"네, 엄마"
나는 급히 딜도를 옆에 있는 메신저 백에 숨기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을 나가 대문을 열려는데 아직 죽지안고 팽팽한 물건이 추리닝을 볼 성 사납게 밀어 붙이며 튀어나와 있다.
나는 한손을 주머니에 넣고 물건을 잡아 붙이며 대문을 열었다.
"도련님.."
"사돈오빠"
"사돈오빠.."
"아저씨.."
이런 온가족이 다 온 건가? 그럼 주희도?
하지만 주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들어가세요, 형수님"
"자..주미, 주연이도 들어가"
나는 성민이를 안아 들려다가 아직 불근 솟아 있는 물건을 의식하며 그냥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 우리 성민이도 왔네.. 엄마는?"
"엄만 아파요"
주미가 덧붙인다.
"많이 났는데요.. 혼자 있고 싶데요"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 하다.
나는 수다를 떨고 있는 그들을 놔두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주희가 보고 싶다. 아니 지금 주희를 꼭 봐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형수님이 왔는데..
한참을 망설이던 나는 외출 준비를 시작 했다.
그리고는 주희에게 전화를 한다.
역시 꺼져있다.
집으로 전화를 돌리는데 누가 노크를 한다.
전화기를 침대에 던져놓고 살짝 문을 여니 형수님이다.
"도련님.."
"형수님.."
형수님이 방으로 들어오자 나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계단을 볼 수 있게 한 다음 그녀를 껴안았다.
형수님도 내 어깨위로 손을 올려 나를 껴안는다.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그녀가 발꿈치를 살짝 들며 고개를 들어 내 혀가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혀와 혀가 뒤엉키며 뒤섞인 타액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녀가 숨이 점점 가빠지는지 나를 살짝 밀어낸다.
“하우,하우..”
손을 뻗어 그녀의 턱에 흐르는 침을 닦아 주었다.
그녀가 가쁜 숨을 내쉬며 묻는다.
“하우, 하우, 그런데 도련님, 어디 나가시게요?”
“네, 금방 올꺼에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묻어나오고 있다.
눈물이 약간 고인다.
“도련님, 혹시..제가..”
“네? 형수님 무슨 말이에요?”
“..”
잠시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던 그녀가 다시 말한다.
“아니에요, 도련님.. 정말 금방 오실꺼죠?”
“네, 그럼요”
그녀가 내 품에 안겨든다.
“도련님, 저 좀 꼭 안아주세요!”
내가 그녀를 껴안자 그녀가 뒤꿈치를 들고 적극적으로 내 입술을 찾는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았던 손을 내려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그때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나와 그녀가 놀래서 허겁지겁 떨어지는 순간 문이 열렸다.
*** 허접한 글이지만 즐겁게 읽어주시고 또 추천에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추천이 많고 댓글이 더 남겨지면 신이 나는건 사실이지만 꼭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재미있고 즐겁게 읽어주시고 간혹 남겨주시는 댓글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층 내 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윤경란, 45의 나이답지 안게 정열적인 생동감이 넘치는 카페 여주인의 이름이다.
대포 항에 도착한 우리는 운 좋게 구한 자연산 다금바리와 광어회를 소주와 맛나게 걸쳐댔다.
바다는 인간에게 자유와 여유를 준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했던 것들도 튀어나와 파도를 타고 소리를 질러대기도 한다. 그녀와 나도 그랬다. 일출이 시작되는 여명 무렵 그녀가 아까와는 달리 그녀의 어두운 그림자를 털어 놓기 시작했다.
대구 **대 메이퀸으로 날리던 그 시절, 그녀는 대구에서 몇 째 안가는 섬유회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한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거기에 도쿄대 출신인 남편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혼 생활을 하던 그때 호사다마라던가 일이 터졌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돼 버린 것이다.
그 후 5년이란 세월을 남편을 간호하며 지내던 그녀는 어느 날 밤 지금의 남편인 운전기사 강**에게 강간을 당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람을 유치장에 쳐너었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게 두려웠던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그에게 질질 끌려 다니게 돼 버렸었다. 그러다가 임신까지 하게 됐고 결국은 그 사람과 대구를 떠나 여기 저기 다니다가 일 년 전쯤 친정의 도움으로 양평에 정착을 했다고 한다.
그녀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을 전 남편에게 볼 면목이 없다며 훌쩍훌쩍 눈물을 흘린다.
차로 돌아온 우리는 취기가 어느 정도 가실 때까지 주차장에서 잠을 청했고, 그때 나도 그녀에게 내 그늘을 털어 놓았다. 재혼하신 부모님일이며, 이복형제의 일, 그리고는 결국 형수와 주희의 일까지.. 가감 없이 솔직히 모든 걸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내 이야기가 다 끝나자 순간순간 야릇한 표정을 짓던 그녀의 얼굴이 사뭇 진지하다.
"자갸, 진짜 사냥꾼은 자기가 잡은 새든 스스로 날아든 새는 새장 안에 가둬두지 안는데.. "
나는 대답대신 손을 그녀의 추리닝 속에 밀어 넣으며 은밀한 곳을 기습했다.
보지 물로 흥건히 젖어있다. 그녀의 보지 속에 손가락을 밀어 넣으며 말했다. "
"피.. 남은 심각하게 말하는데.. 이게 뭐에요?"
"어머, 내가 무슨 보살인줄 아나봐? 그런 말 듣고 아무러치도 안은 사람 있음 자기가 데려와바.."
"하하, 그런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며 그녀의 클리를 만져본다.
"아이이, 안 돼 자기야.. 저기 사람들이.." 그녀가 내손을 잡아 슬그머니 빼놓는다.
그렇게 윤경란 그녀와의 우연이었지만 뜨거웠던 만남을 되새기다가 잠이 들었다.
아름다운 새들이 내 주위를 날고 있다. 나는 새장을 열고 새 들을 잡아넣는다.
내 새장이 아름다운 새들로 가득 찼고 나는 새장 문을 닫아걸었다.
갑자기 새장속 새들이 날갯짓을 시작하며 새장 밖으로 깃털을 뿜어내고 있다.
그 중 한마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안 돼"
다시 한 마리가 쓰러진다.
"안 돼에"
또 다시 쓰러진다.
"안돼에에에"
잠에서 깨어났다. 얼마나 잔걸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온다.
"무슨 꿈이 이렇지.."
솓구쳐오르는 갈증에 물을 찾아 거실로 나갔다.
어머님이 점심을 준비 중이시다.
"무슨 잠을 그렇게 자니?"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웬 음식?"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라, 니 형수도 곧 올꺼고.."
"네, 엄마"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찾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방으로 다시 들어온 나는 침대에 몸을 뉘였다.
"형수가 온다고?"
그러고 보니 형수와 만난 지도 꽤 된 것 같다.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켜 침대 밑에서 포장된 박스를 찾아 꺼냈다.
다음 달 형수님 생일 선물이다. 내 얼굴에 짓궂은 미소가 머금어 진다.
"그냥 오늘 쓸까?"
망설이던 나는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꺼냈다.
핑크색 딜도다. 귀두 부분이 유난이 두껍고 몸체에는 오돌토돌 돌기들이 솟아 있다.
건전지를 끼고 리모트를 누르자 뱀처럼 똬리를 틀며 회전을 시작한다.
형수님의 반쯤 벌어진 입사이로 들어난 고운 치아와 감겨있는 혀가 보일 듯 말 듯 한 야릇한 표정이
떠올라지며 아래쪽이 묵직해 진다.
딩동
밖에서 벨이 울린다.
"정후야, 좀 나가보렴"
"네, 엄마"
나는 급히 딜도를 옆에 있는 메신저 백에 숨기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을 나가 대문을 열려는데 아직 죽지안고 팽팽한 물건이 추리닝을 볼 성 사납게 밀어 붙이며 튀어나와 있다.
나는 한손을 주머니에 넣고 물건을 잡아 붙이며 대문을 열었다.
"도련님.."
"사돈오빠"
"사돈오빠.."
"아저씨.."
이런 온가족이 다 온 건가? 그럼 주희도?
하지만 주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들어가세요, 형수님"
"자..주미, 주연이도 들어가"
나는 성민이를 안아 들려다가 아직 불근 솟아 있는 물건을 의식하며 그냥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 우리 성민이도 왔네.. 엄마는?"
"엄만 아파요"
주미가 덧붙인다.
"많이 났는데요.. 혼자 있고 싶데요"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 하다.
나는 수다를 떨고 있는 그들을 놔두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주희가 보고 싶다. 아니 지금 주희를 꼭 봐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형수님이 왔는데..
한참을 망설이던 나는 외출 준비를 시작 했다.
그리고는 주희에게 전화를 한다.
역시 꺼져있다.
집으로 전화를 돌리는데 누가 노크를 한다.
전화기를 침대에 던져놓고 살짝 문을 여니 형수님이다.
"도련님.."
"형수님.."
형수님이 방으로 들어오자 나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계단을 볼 수 있게 한 다음 그녀를 껴안았다.
형수님도 내 어깨위로 손을 올려 나를 껴안는다.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그녀가 발꿈치를 살짝 들며 고개를 들어 내 혀가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혀와 혀가 뒤엉키며 뒤섞인 타액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녀가 숨이 점점 가빠지는지 나를 살짝 밀어낸다.
“하우,하우..”
손을 뻗어 그녀의 턱에 흐르는 침을 닦아 주었다.
그녀가 가쁜 숨을 내쉬며 묻는다.
“하우, 하우, 그런데 도련님, 어디 나가시게요?”
“네, 금방 올꺼에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묻어나오고 있다.
눈물이 약간 고인다.
“도련님, 혹시..제가..”
“네? 형수님 무슨 말이에요?”
“..”
잠시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던 그녀가 다시 말한다.
“아니에요, 도련님.. 정말 금방 오실꺼죠?”
“네, 그럼요”
그녀가 내 품에 안겨든다.
“도련님, 저 좀 꼭 안아주세요!”
내가 그녀를 껴안자 그녀가 뒤꿈치를 들고 적극적으로 내 입술을 찾는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았던 손을 내려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그때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나와 그녀가 놀래서 허겁지겁 떨어지는 순간 문이 열렸다.
*** 허접한 글이지만 즐겁게 읽어주시고 또 추천에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추천이 많고 댓글이 더 남겨지면 신이 나는건 사실이지만 꼭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재미있고 즐겁게 읽어주시고 간혹 남겨주시는 댓글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