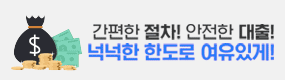무게 - 에필로그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일주일째 그의 손길을 느끼질 못했다. 12월의 모든 부산물은 25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성오가 없는 나는 내내 제자리였다. 자물쇠가 걸려져 있는 줄이 들어있는 서랍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다가가 자물쇠를 만지작거렸다.
“이모가 여긴 웬일이야. 날 어떻게 찾았어?”
“학과 사무실에 갔었어.”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야?”
“….”
“이 주인님이 보고 싶어서 온 거구나. 기분 좋은데.”
난 그의 팔짱을 끼고 캠퍼스를 벗어나 근사한 저녁식사를 했다.
“사흘 남았지?”
“응. 아 지겹다.”
“그저께 나 없을 때 왔다 갔지? 빨래 다 해놨어.”
“….”
그는 말없이 음식을 먹으면서 날 쳐다봤다.
“남자 둘이서 지내니까 힘들지?”
“응 그렇지.”
“난 오늘 방학했어.”
“그러고 이모. 별장주인한테 연락해서 22일 오후부터….”
“전화해서 예약했어.”
“하하하”
그의 웃음에 난 부끄러웠다. 금새 고개가 숙여졌다.
“다 먹었으면 가자. 이모 계속 보고 있으면 공부가 안될 거 같아.”
“응 그래. 내가 괜히 왔나 봐.”
“아니야. 이모 보니까 좋아.”
그 해의 겨울은 여름보다 더 혹독했다. 그는 날 마치 얼려 죽일 듯이 날 추위 속에서 모질게 괴롭혔다. 그가 날 거칠게 다룰수록 난 더 뜨거워졌고, 난 더 그의 가학을 탐했다.
“수영아 넌 아직도 탱탱하니? 비결이 뭐야. 얘는 주름도 없어. 너 남자 있어?”
“아니. 없어.”
“비결이 뭐야? 속썩이는 남편이랑 애가 없어서 그런 거야?”
“….”
“혼자 살면서 수영이 넌 방 3개짜리 빌라는 왜 얻은 거야?”
“응. 조카랑 같이 살아.”
“그 잘 생긴 조카? 걔는 장가 안가니?”
“몰라.”
“네 집에 놀러 가보자. 응?”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나중에 놀러 와.”
“성오야. 이모는?”
“몰라.”
“내가 온다고 말했던 거 같은데, 혹시 남자 만나러 간 거 아니야?”
“몰라. 이모 말없는 알잖아.”
“넌 말이 많고?”
“엄마는 잘 알면서 그러네.”
“일주일에 한마디는 하고 사니?”
“몰라.”
“회사는 다닐 만 하고. 그 싫다는 지방발령은 아직 안 난거야?”
“아직 그런 말은 없어.”
“이렇게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너 장가 안가?”
난 이불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날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묶여 있었다. 발가벗긴 채 hogtie로 묶여 이불장안에 갇혔다. 언니가 이불장만 열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언니는 곧 창원으로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알몸으로 꽁꽁 묶인 채 언니의 목소리를 듣는 건 짜릿하기도 했지만, 두려웠고 상당한 어색함이었다. 처음부터 너무 긴장을 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였는지, 얼마 있다가 묶인 채 잠이 들었다.
“성오는 잘 지내는 거 같아?”
“으~응.”
“됐다. 걔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그리고, 언제까지 네 집에 있겠다는 말은 없고?”
“없어.”
“둘이서 말은 하고 사니? 말수 없는 둘이 사니 뭘 알겠냐!”
“….”
“어이구 내 팔자야. ”
“언니 내가 잘 돌볼게요.”
“결혼까지 한 놈을 돌보긴 뭘 돌봐.”
“….”
“그래 아무래도 네가 걔 맘을 잘 알 거야, 엄마로서 미안하다. 우리랑은 통 말을 하려고 하질 않아.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
“저 별장 주인이에요.”
“아! 네. 웬일이세요.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고.”
“그게. 저….”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그 아저씨 말씀인가요?”
“예. 2년 전에….”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씩 들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하신 건 무슨 일 때문에….”
“….”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통통한 얼굴에 주름이 지면서 수척해 보였다. 갑작스럽게 변한 그녀를 보면서 난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외로우신가요?”
“네.”
“주인님이 필요 하신가요?”
“….”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별장을 그냥 드릴게요.”
“별장을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돈도 다 드릴게요.”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요.”
“….”
“혹시 사진하나 있으세요?”
“제 사진요?”
“네.”
“두 명이라….”
“….”
“이모보다 나이가 많잖아.”
“으~응. 4,5년 정도 차이가 날 거야.”
“그건 그렇고. 별장도 주고, 자기 재산도 다 준다는 게 사실이야?”
“응.”
“이모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아니 네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 여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였어?”
“응. 넋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이었어.”
“…”
“이게 마로 된 줄인가요?”
“네”
“면으로 된 줄과 비교해서 느낌이 다른가요?”
“네”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마로 된 줄에 묶인 후로는 한번도 면으로 된 줄에 묶여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님”
“아직 주인님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전 아직 어색해서…”
“네”
“하악 하악 아~….”
깊은 신음소리 때문에 이른 아침 눈을 떴다. 그녀가 알몸으로 기둥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오의 조그마한 손길에도 그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2년 전이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나를 조여왔다. 성오의 손길 없이 내가 2년을 보내게 된다는 걸 생각하는 그녀의 몸짓하나하나 토해내는 신음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묶은 마줄이 그녀를 더 정갈하게 꾸몄다. 다른 여자가 묶여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본 것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의 처절한 흥분은 그녀를 더 돋보이게 했고, 그녀는 환하고 거칠게 피어 올랐다. 나는 성오에게 그녀를 소개시켜 준 걸 조금씩 후회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묶여 있었다. 집에 가득 채워진 그녀의 욕정이 날 더 억눌렀고, 흥분시켰다. 그녀에게 집중한 성오가 조금씩 멀어져 보였다. 성오의 눈에 서린 광기가 그녀의 환하게 비췄다.
나를 짓누르는 이 무게는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 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눌 수 없다면, 그 무게를 벗을 길은 죽음뿐이다.
의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무게를 느낄 것이고 그 무게 때문에 신음할 것이다.
그 신음은 깊어갈 것이고, 세월이 흘러 우리의 육체가 쇠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괴감과 지독한 결여가 우릴 갉아먹을 것이다.
무게를 나누는 것 외에는 그 어느 선택이나 처방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끝.
“이모가 여긴 웬일이야. 날 어떻게 찾았어?”
“학과 사무실에 갔었어.”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야?”
“….”
“이 주인님이 보고 싶어서 온 거구나. 기분 좋은데.”
난 그의 팔짱을 끼고 캠퍼스를 벗어나 근사한 저녁식사를 했다.
“사흘 남았지?”
“응. 아 지겹다.”
“그저께 나 없을 때 왔다 갔지? 빨래 다 해놨어.”
“….”
그는 말없이 음식을 먹으면서 날 쳐다봤다.
“남자 둘이서 지내니까 힘들지?”
“응 그렇지.”
“난 오늘 방학했어.”
“그러고 이모. 별장주인한테 연락해서 22일 오후부터….”
“전화해서 예약했어.”
“하하하”
그의 웃음에 난 부끄러웠다. 금새 고개가 숙여졌다.
“다 먹었으면 가자. 이모 계속 보고 있으면 공부가 안될 거 같아.”
“응 그래. 내가 괜히 왔나 봐.”
“아니야. 이모 보니까 좋아.”
그 해의 겨울은 여름보다 더 혹독했다. 그는 날 마치 얼려 죽일 듯이 날 추위 속에서 모질게 괴롭혔다. 그가 날 거칠게 다룰수록 난 더 뜨거워졌고, 난 더 그의 가학을 탐했다.
“수영아 넌 아직도 탱탱하니? 비결이 뭐야. 얘는 주름도 없어. 너 남자 있어?”
“아니. 없어.”
“비결이 뭐야? 속썩이는 남편이랑 애가 없어서 그런 거야?”
“….”
“혼자 살면서 수영이 넌 방 3개짜리 빌라는 왜 얻은 거야?”
“응. 조카랑 같이 살아.”
“그 잘 생긴 조카? 걔는 장가 안가니?”
“몰라.”
“네 집에 놀러 가보자. 응?”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나중에 놀러 와.”
“성오야. 이모는?”
“몰라.”
“내가 온다고 말했던 거 같은데, 혹시 남자 만나러 간 거 아니야?”
“몰라. 이모 말없는 알잖아.”
“넌 말이 많고?”
“엄마는 잘 알면서 그러네.”
“일주일에 한마디는 하고 사니?”
“몰라.”
“회사는 다닐 만 하고. 그 싫다는 지방발령은 아직 안 난거야?”
“아직 그런 말은 없어.”
“이렇게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너 장가 안가?”
난 이불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날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묶여 있었다. 발가벗긴 채 hogtie로 묶여 이불장안에 갇혔다. 언니가 이불장만 열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언니는 곧 창원으로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알몸으로 꽁꽁 묶인 채 언니의 목소리를 듣는 건 짜릿하기도 했지만, 두려웠고 상당한 어색함이었다. 처음부터 너무 긴장을 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였는지, 얼마 있다가 묶인 채 잠이 들었다.
“성오는 잘 지내는 거 같아?”
“으~응.”
“됐다. 걔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그리고, 언제까지 네 집에 있겠다는 말은 없고?”
“없어.”
“둘이서 말은 하고 사니? 말수 없는 둘이 사니 뭘 알겠냐!”
“….”
“어이구 내 팔자야. ”
“언니 내가 잘 돌볼게요.”
“결혼까지 한 놈을 돌보긴 뭘 돌봐.”
“….”
“그래 아무래도 네가 걔 맘을 잘 알 거야, 엄마로서 미안하다. 우리랑은 통 말을 하려고 하질 않아.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
“저 별장 주인이에요.”
“아! 네. 웬일이세요.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고.”
“그게. 저….”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그 아저씨 말씀인가요?”
“예. 2년 전에….”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씩 들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하신 건 무슨 일 때문에….”
“….”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통통한 얼굴에 주름이 지면서 수척해 보였다. 갑작스럽게 변한 그녀를 보면서 난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외로우신가요?”
“네.”
“주인님이 필요 하신가요?”
“….”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별장을 그냥 드릴게요.”
“별장을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돈도 다 드릴게요.”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요.”
“….”
“혹시 사진하나 있으세요?”
“제 사진요?”
“네.”
“두 명이라….”
“….”
“이모보다 나이가 많잖아.”
“으~응. 4,5년 정도 차이가 날 거야.”
“그건 그렇고. 별장도 주고, 자기 재산도 다 준다는 게 사실이야?”
“응.”
“이모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아니 네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 여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였어?”
“응. 넋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이었어.”
“…”
“이게 마로 된 줄인가요?”
“네”
“면으로 된 줄과 비교해서 느낌이 다른가요?”
“네”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마로 된 줄에 묶인 후로는 한번도 면으로 된 줄에 묶여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님”
“아직 주인님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전 아직 어색해서…”
“네”
“하악 하악 아~….”
깊은 신음소리 때문에 이른 아침 눈을 떴다. 그녀가 알몸으로 기둥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오의 조그마한 손길에도 그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2년 전이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나를 조여왔다. 성오의 손길 없이 내가 2년을 보내게 된다는 걸 생각하는 그녀의 몸짓하나하나 토해내는 신음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묶은 마줄이 그녀를 더 정갈하게 꾸몄다. 다른 여자가 묶여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본 것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의 처절한 흥분은 그녀를 더 돋보이게 했고, 그녀는 환하고 거칠게 피어 올랐다. 나는 성오에게 그녀를 소개시켜 준 걸 조금씩 후회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묶여 있었다. 집에 가득 채워진 그녀의 욕정이 날 더 억눌렀고, 흥분시켰다. 그녀에게 집중한 성오가 조금씩 멀어져 보였다. 성오의 눈에 서린 광기가 그녀의 환하게 비췄다.
나를 짓누르는 이 무게는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 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눌 수 없다면, 그 무게를 벗을 길은 죽음뿐이다.
의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무게를 느낄 것이고 그 무게 때문에 신음할 것이다.
그 신음은 깊어갈 것이고, 세월이 흘러 우리의 육체가 쇠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괴감과 지독한 결여가 우릴 갉아먹을 것이다.
무게를 나누는 것 외에는 그 어느 선택이나 처방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