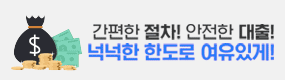소낙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그녀를 만난 것을 운명이라 말하진 않겠다.
차에서 빨리 걸어도 십분 정도는 걸어야 집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도 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있기는 했지만 맑은 날씨라고 봐도 될 정도로 태양이 하늘 높이 걸려있다.
두어개의 언덕을 오르 내려야 집까지 도착할텐데 때약볕이 내리 쬐는 통에 등줄기에선 어느새 땀방울까지 송송 맺혀 흐르고 콧잔등에도 이슬이 맺힌 듯했지만 늘상 그런 경험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이 소매깃으로 콧잔등을 닦는게 전부였다.
언덕 하나를 막 넘었을 때.
밝은 하늘의 저 편에서 억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쏟아지는 빗줄기를 충분히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소낙비의 광경은 신기하게만 여겨졌다.
어쩌면 구름 신선의 오줌 누는 장면을 지켜 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경외로움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 작은 비는 순간적으로 확산되면서 멀쩡하게 태양이 비추고 있는 언덕 전체를 흠뻑 적셔 버렸다.
그 비로 온 몸은 젖은 생쥐꼴이 되고 말았다.
웃다가 당한 장대비의 공격은 언덕에서는 피할 곳도 전혀 없다.
지나가는 비를 피하려고 나뭇가지 무성한 곳으로 몸을 움직였다.
하늘은 이내 시꺼멓게 변해 버리고 한참이 지나도 빗줄기는 잣아질 것 같지 않았다.
한 여자가 언덕을 오르고 있다.
커다란 우산을 받쳐 들고 있다.
화사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우산을 바쳐든채 걷고 있다.
살짝 미소지으며 흠뻑 젖은 내 머리 위로 우산을 내밀었다.
눈 빛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을 뿐이다.
어디까지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냥 우산에 뭍혀 그 여자가 걷는데로 따라 걸었다.
"여기가 니네 집이니?"
"응, 넌 어떻게 알아?"
"널 항상 보고 있었어."
"널 처음 보는데?"
"니네 집 창문에서 올려다 보이는 저 집이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서 보면 창문틀만 보일텐데 그 쪽에서 보면 방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집이었다.
"우산 고마웠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지나쳤을텐데, 너라서..."
그 여자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나 보다.
하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비 탓으로 추운지 입술이 파리했다.
향긋한 아카시아 꽃 냄새가 났다.
"우리 집에는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
"너희 꺼 였구나. 꿀 많이 따 먹었었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본 후에야 그 여자는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문 앞에 놓인 우산을 찾아 바쳐들고 그 여자의 뒤를 쫒았다.
"왜 왔어?"
"응, 너희 집까지 바라다 주려고."
"우산 접어. 내 걸루 함께 쓰면 되잖아."
나는 펼쳤던 우산을 다시 접고 그 여자의 우산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여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녀린 허리를 바치는 작은 엉덩이와 길게 뻗은 두 다리가 하늘 거리며 걷고 있다.
아카시아 나무 밑은 우산을 접어도 될 정도로 가지들이 넓은 지역을 가려 줬다.
"이름이 뭐니?"
"명식이, 김명식."
"난 이미정."
"태어나서 너 처럼 예쁜 여자는 첨보는 것 같아."
"난 창문을 통해 너를 볼때마다 각시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
"안아보고 싶은데 괜찮겠니?"
"절대 안돼지만 딱 한번만 해봐."
나는 미정의 허리를 꼬옥 안았다.
개미처럼 가는 허리라고 생각했다.
착 안기는 것이 진정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촉촉한 입술이 내 얼굴에 닿았다.
두 팔이 목에 감기며 당기듯 얼굴을 덮어오는 미정을 볼 수 없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봉긋한 가슴이 느껴졌다.
한 손으로 엉덩이를 잡아끌며 더 가까이 닿았으면 하는 갈망의 마음이 가득했다.
"너를 사랑해. 죽을 때까지."
미정의 저돌적인 구애에 나는 할 말을 잊었을 뿐이지만 가슴은 몹시 뛰고 있었다.
"널 첨 봤지만 전혀 낯설지 않아. 도대체 어디 있다 나타난거니?"
"난 너를 위해서만 존재했었어. 너도 그럴 수 있겠니?"
"응, 너의 마음 다치지 않도록 노력할 께."
몇 달이 지났다.
미정은 우연을 가장해서든 고의적이든 내 눈 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
미정은 창문 아래로 비치는 명식을 그리워 하며 책상머리를 그 쪽으로 옮기고, 집에 돌아와서 생기는 모든 일상을 바라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듯했다.
명식도 불꺼진 창문을 아무리 올려다 봐도 미정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서로를 그리워 한다는 마음에 수음으로써 미정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뿐이었다. 어쩌면 젊은 총각이 불쑥 젊은 여자 집을 노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더 가슴만 태웠을 것이다.
"엄마, 저 위로 보이는 집 잘 알아?"
"왜?"
"그집 딸도 알아?"
"미인이었지."
"몇달 전 갑자기 소나기 쏟아질 때 우산 바쳐주더라."
"정말?"
"응, 아카시아 향기가 물씬 풍기던걸."
"그랬구나."
"왜?"
"어제 그 아가씨 죽었다더라. 니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이 귀에 맹맹 울려 퍼졌다.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부른 내 이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싶어 박차고 그 집문을 열어 재켰다. 상주들이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미정아!"
"누구슈?"
"김명식입니다."
중년의 여인이 다가와선 두 손을 꼭 잡아쥐며 반겨 맞는 듯 하더니 대성통곡을 한다.
몇 달째 중병을 앓듯이 누워 있다가 같다고 한다.
"명식이가 왔다, 미정아."
엄마와 미정의 부모의 상의하에 미정의 관속에는 내 옷 한벌을 넣어주도록 했다.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음부를 명식이 총각에게 만지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는데 이를 어쩌나 난망하였다고 했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모든 사람을 물린 채 미정의 수의를 걷어 내고 실하나 없는 나신을 샅샅이 눈에 새겨야 했다. 한번쯤 주고 싶었던 육체를 명식이 손으로 만지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최소한 죽을때까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명식은 굳은 두 다리 사이에 손바닥을 덮고 아직도 살아 있는 듯한 온기를 느끼며 미정의 음부를 정성스럽게 만져 본다.
영원히 미정의 마음속에만 뭍혀 버렸을 사랑의 진실은 그날 소낙비를 통해 겨우 전달 되었지만 너무 짧은 생을 마감한 탓에 현실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자신의 맘속에 뭍은 진실을 죽을 때 까지 한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더 많은 사람들에 비해 미정의 죽음은 다소나마 작은 위로가 될 뿐이다. [끝]